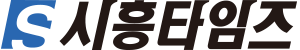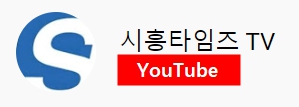[글: 이상범]
그(녀)가 최선이다
바야흐로 대선大選 정국이다. 그런데 어째 최선을 가리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최악을 구별해야 하는 아수라장이다. 죽임의 언어, 저주의 말이 난무하는 시절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어지럽다고 피할 일이 아니다. 더럽다고 외면할 일이 아니다. 흥분한 관객이 되어 생각 없이 편들고 나설 일은 더욱 아니다. 난장판일수록 지혜롭고 엄격한 심판이 필요하다. 맹목적 관객의 무모함을 잘 알지 않는가. 편파적인 심판이 경기를 어떻게 망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흥분을 가라앉혀야 한다. 냉철해야 한다. 엄격해야 한다.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나를 대변한다. 나는 내 표를 통해 나를 증명한다. 나의 투표가 나다. 나는 내 표를 통해 정치한다. 내 한 표를 통해 국가를 책임진다. 내가 대통령이다.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고귀한가. 얼마나 엄혹한가.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누구에게 그 막중한 직책을 위임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위임하려는 자가 마땅치 않아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인내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다. 그것이 선거다. 피해갈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엄연한 현실이다. 최선을 다해 후보자의 뒤를 파헤치다 보니 참으로 어이없다. 저런 사람에게 대통령으로서의 내 권한을 위임해도 되는 건가 싶다. 위임할 수밖에. 다른 방법 없다. 지금 그(녀)만한 사람 없다. 그(녀)가 최선이다. 그(녀)가 후보인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현재가 미래다
그(녀)는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 그 희망은 어디에 걸어야 하나. 대통령 될 자격을 논할 필요는 없다. 자격 여부는 법적으로 따지면 될 문제다. 우리의 관심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 보유 여부이다. ‘대통령직 수행능력평가’.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말고 현재. 헛헛한 미래 말고 현재. 지금 그(녀)의 상태, 능력. 지금 그(녀)의 생각, 가치관, 철학.
어찌 과거를 무시할까. 어찌 미래를 가벼이 여길까. 그러나 다시 보라. 그들의 과거는 그들의 현재에 있다. 과거를 대하는 현재의 태도에 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다만 그 실수를 대하는 자세가 저마다 다를 뿐이다.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변화와 성장의 미래가 기다린다. 반성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실수의 반복과 도태, 파멸이 있을 뿐이다.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실수를 부정하며 더 큰 실수로 이어지는 삶도 있다.
마치 ‘과거 세탁’을 꾀하는 자들처럼. 세탁으로 과거를 지울 수 없다. 깨끗해질 수 없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세탁은 겉을 닦는 일이다. 옷을 갈아입는 일이다. 주름을 펴는 일이다. 과거는 세탁의 대상이 아니다. 과거는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다. 포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다. 과거를 터는 방법은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다.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이다. 인정에 그치지 않고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 변화되려는 노력이다. 변신이 아니라 변화다. 그 결과 변화된 현존재가 다시 부끄러울 일 없는 삶의 자세로 전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우리의 판단 근거는 지금 그(녀)의 정신상태다. 삶의 자세다.
그(녀)의 말이 그(녀)다
정치에 어찌 실정失政이 없겠는가. 인생에 어찌 실수가 없겠는가. 실정이야말로 정치의 역사 아니겠는가. 끊임없는 대안과 대책이야말로 정치의 본령 아니던가. 실수야말로 인간 성장의 동력 아니던가. 문제는 실정, 실수가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자세, 태도다. 때로는 너무 막막하여 확실한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선이 별안간 최악이 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 실정. 그러나 국민은 실정만으로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는다.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두고 억지 부리지도 않는다. 유권자들은 정치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쯤은 잘 안다. 문제는 실정을 대하는 정치인의 자세다. 그(녀)는 실정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반성하는가, 변명하는가. 수정하는가, 고집하는가. 실패의 연속으로 일관된 정치에 무슨 희망을 품겠는가. 변명으로 점철된 정치가의 삶에 무슨 기대를 걸겠는가. 반복되는 실수는 더는 실수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정체다.
정치는 미래를 파는 장사인가. 그렇다, 긍정한다면 누구의 미래를 살 것인가. 누구의 꿈에 올라탈 것인가. 안타깝게도 많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한다. 공약空約은 마약이다. 생각 없이 즐기다 보면 어느새 사로잡히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갈증으로 유혹하는 신기루다. 그런데 어떤 게 공약空約, 마약인지를 구별하기가 만만치 않다. 누구의 약속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누구의 청사진을 손에 쥘까.
과거를 현재에서 풀었듯이 미래 또한 현재에서 모색해야 한다. 그(녀)의 꿈이 아니라 현실로 가려야 한다. 시인 고은은 말한다. “나는 누구가 아니라, 누구가 나인 것”(「통정」 중 일부)이라고. 주관적 나가 아니라 객관적 나가 실재의 나일 것이라는 의미다. ‘보여지고 싶은’ 그(녀)가 아니라 ‘보여지는’ 그(녀)가 실체에 가깝다는 뜻이다.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 속에 이미 똬리를 틀고 있다는 의미다. 그(녀)의 주장이 아니라 그(녀)의 실체에서 그(녀)의 미래를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눈 씻고 보라. 보인다.
귀 씻고 들어라. 그(녀)의 말은 그(녀)의 생각이고, 그(녀)의 생각은 그(녀)의 행적이고, 그(녀)의 행적은 바로 그(녀)다. 그(녀)의 말이 바뀌려면 그(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그(녀)의 생각이 바뀌려면 그(녀)의 행적이 바뀌어야 하고, 그(녀)의 행적이 바뀔 때 비로소 그(녀)가 바뀐다. 그(녀)의 말이 그(녀)다. 그러므로 그(녀)의 입에 귀를 기울여라. 입은 영혼의 통로다. 말은 영혼의 외침이다. 그(녀)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혹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혹은 할 말조차 없어 보이는가. 그것이 그(녀)의 마음의 풍경이다. 맑은가. 아름다운가. 따뜻한가. 곁들고 싶은가. 그 마음의 풍경이 곧 우리가 몸담고 살아갈 풍경이라면 기대할 만한가. 행복하겠는가.
그(녀)의 말이 그(녀) 이듯, 내 말이 나다. 그(녀)에게 엄격하듯이 나 자신에게도 엄격해야 한다. 위임하려는 후보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부족하지 않던가. 그(녀)와 함께 나도 변해야 한다. 잊지 말자. 내가 누구인가를. 상기하자. 내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판을 바꾸자
그(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자. 없는가. 그럴 리가. 없을 리 만무하다. 흠잡고 욕하고 저주해서 남을 것은 절망뿐이다. 상처뿐이다. 황폐해지는 건 우리 마음이다. 망하는 건 우리 사회다. 어떻게 해서든 부정적 분위기를 긍정적 기운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저주의 판을 축제의 판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욕하는 세상은 반목이 난무하고, 칭찬하는 세상은 창조력이 넘친다. 흠잡는 세상에는 무능력자들이 판을 치고, 긍정의 눈으로 살피는 세상에는 능력자들이 넘쳐난다. 칭찬하는 사람은 부유하고 욕하는 사람은 가난하다. 칭찬하는 세상에서는 타인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가 하면, 욕하는 세상에서는 내 능력조차 무시된다. 그러니 찾아야 한다. 칭찬하고 응원해야 한다. 칭찬은 배움의 자세다.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고 나의 약점을 직시하는 자세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던가. 고래의 춤은 겸손에 대한 찬사가 아닐까. 자기를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에 대한 감사의 인사 아닐까. 어디 고래뿐이랴. 춤이라면 단연 인간 아니던가. 싸움판일지 춤판일지는 우리가 결정하면 될 일이다.
내가 대통령의 대통령이다
내가 대통령의 대통령이다. 내가 진짜 대통령이다. 그러니 나를 대통령으로 섬길 대통령을 가리면 될 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내 정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시하고 나무라고 경고하고 채찍질하기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밀어주고 응원하고 칭찬해주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너무 억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막막하지 않게 술로 달래고 담배로 위로하고 마음으로 안아주며 동행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책무다.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되어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은 원망에 체하고 공감에 속이 뚫린다. 내가 그렇듯이, 네가 그렇듯이.
* 이 글은 “시흥문화” 제24권에 실린 글입니다.